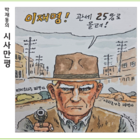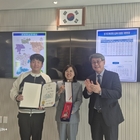8월 6일은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이후 80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뿐 아니라 당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그 후손들은 여전히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원폭 피해자들을 향한 위로와 국가 책임의 강화를 강조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두 도시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8월 14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전쟁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그 대가로 70만 명이 피폭됐고, 최소 23만 명이 사망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다.
한국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일본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약 10만 명이 원폭 피해를 입었고, 이 중 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약 4만 3000명의 생존 피폭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나 의료 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이들은 만성 질환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의료 지원은커녕 취업과 결혼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야 했다. 방사능의 유전적 영향은 2세, 3세로 이어졌고, 건강 문제와 사회적 배제 속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다.
원폭 피해자 2세인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빈혈과 위암, 관절통으로 고생했다”며 유전적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그러나 현행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7년 제정)은 원폭이 투하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임신 중인 태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후손들은 지원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5일 SNS를 통해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 지원 기반이 생겼지만,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은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12일은 일본항공 123편 추락사고 40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520명이 사망해 일본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남아 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8월을 ‘비극의 달’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역시 그 비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