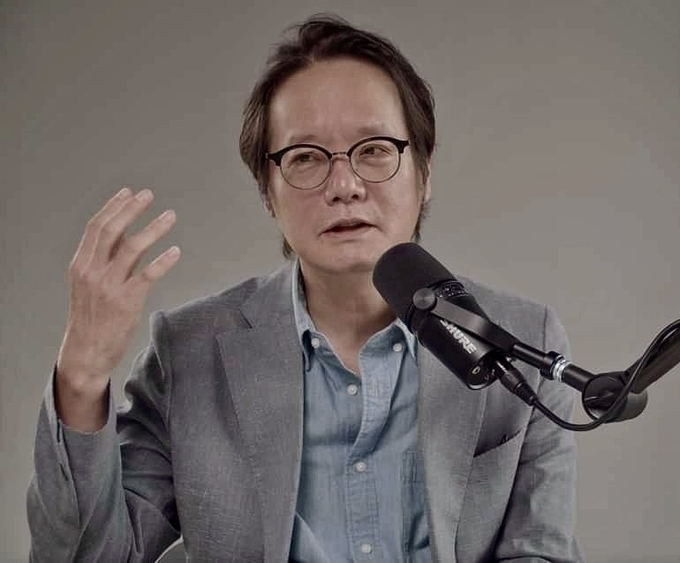
이제 블록버스터의 시대는 끝이 났다. 천만 관객 운운은 쥬라기 월드 시대에나 가능한 꼴이 됐다. 물론 세계 영화계를 얘기하는 것, 특히 할리우드 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할리우드는 여전히 할리우드이며 유럽은 여전히 유럽이다. 그들의 극장 문화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완벽하게 복귀했다. 한국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때에 비해 시장을 50~60% 복구 선까지 밖에 회복하지 못했다. 1년 관객 수는 2019년 2억 2667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코로나 시기를 경유한 현재 올해 상반기는 449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이라면 올 한 해는 1억 명을 넘지 못하게 된다.
이건 꼭 국산 상업영화가 극심하게 부족해서만도 아니다. 국내 극장가에는 국산 영화로는 현재 ‘여름이 지나가면’ ‘봄밤’ 등 독립영화나 저예산 상업영화들로만 채워져 있다. 모두 5천 명 정도의 관객들을 모았다. 애초 규모의 경제학이 실현될 수 없다. 또 한편으로 흑묘백묘 전술도 안 먹히고 있다. 한국 영화가 안되면 할리우드 영화들이 잘돼 줘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되지 않는다. ‘F1 더 무비’는 국내 관객 143만 명 선에 그치고 있어 주연인 브래드 피트의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고 ‘쥬라기 월드 : 새로운 시작’도 175만 명 선, ‘슈퍼맨’ 역시 아직 개봉 초기이긴 하지만 60만 명을 못 넘고 있다. 코로나 이전 때 같으면 첫 주 개봉 때 대체로 120~150만 명 선을 유지하던 게 할리우드 여름용 블록버스터들이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런 시절은 끝났다.
이렇게 된 데에는 코로나19가 아무리 치명적이었다 해도 그 모든 걸 차치하고 시장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한방에 시장을 휘청거리게 만든 셈이다. 5200만이라는 적은 인구에 극장 외에도 OTT, 프로야구, 팝스타 공연 등등 관심거리가 최고로 다양해진 시대이다. OTT 가입자 수는 넷플릭스만 대략 1200만으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월간 이용자 수는 1500만 명 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로야구 관중 수는 지난해 1천만을 넘겼다. 공연 역시 올 초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의 경우 6회 공연에 30만 명을 몰아갔다.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제 극장을 가지 않는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극장용 영화와 비(非) 극장용 영화의 통합 정책으로 시장을 단일 사이즈로 가져가되 규모는 키우는 쪽으로 해야 한다. 상업영화의 경우 한국 시장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만큼 해외시장을 겨냥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나홍진 감독이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등 할리우드 스타를 캐스팅해 750억 원짜리 영화를 제작 중인 것은 지나치게 위험해 보이긴 해도 누군가 시도는 해야 하는 일로 평가된다. 그 한편으로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정부 주도하에 꾸준히 그 문화를 지켜 내야 한다. 산업과 문화를 분리하는 것, 극장과 OTT의 매출을 통합하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