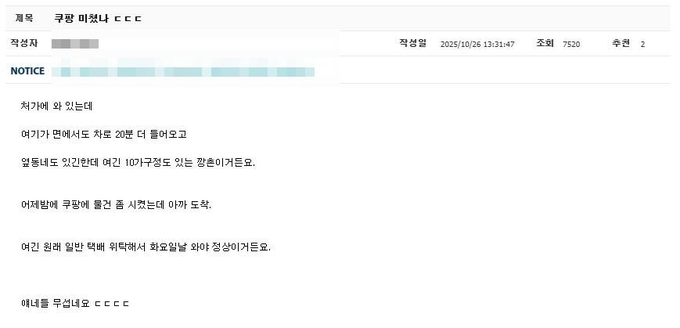
"깡촌에서도 로켓배송이 다음날 도착했다"는 소비자 경험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도시권을 넘어 농어촌 지역까지 배송 경쟁이 확장되는 가운데, 물류 혁신의 실체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면 지역, 10가구 남짓의 외딴 마을에서 주문한 쿠팡 상품이 다음날 도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반 택배의 경우 통상 이틀 이상 걸리거나 특정 요일에만 수거·배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글 작성자는 “솔직히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가진 기존의 ‘농촌 배송 상식’을 뒤집는 체감 사례다.
쿠팡이 구축한 로켓배송 체계의 핵심은 ‘재고를 가진 채로 기다리는 풀필먼트 구조’다. 기존 택배가 주문 이후 상품을 모아 이동하는 방식이라면,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미리 보관한 상태로 예측 기반 출고를 진행한다. 전국 시군구 약 70%까지 커버리지가 확장되면서, 특정 조건이 맞을 경우 면 단위에서도 도시와 유사한 배송 속도가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이러한 사례를 곧바로 전국 평균으로 일반화하긴 어렵다. 상품 종류, 주문 시각, 재고 위치, 지역별 라스트마일 구조 등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배송 속도가 빨라질수록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과 노동 강도 문제 또한 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속도 경쟁 자체는 서비스 진화의 결과지만, 지속 가능성과 균형점 찾기가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소비자 체감의 변화는 분명하다. 농촌의 고령화, 상권 붕괴, 생활편의시설 축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배송 속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활권의 생산·소비를 떠받치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농어촌 소비자에게 ‘다음날 배송’은 애초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쿠팡이 속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물류 체계를 다시 짜자, 깡촌의 일상까지 변화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방 소멸과 고령화가 겹친 지역에서 소비 접근성은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쿠팡의 로켓배송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다. 기존 택배망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웠던 속도를 현실로 만든, 지방 소비의 마지막 인프라다.
쿠팡이 아니었다면 깡촌의 다음날 배송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상’에 머물렀을 것이다.
[ 경기신문 =박민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