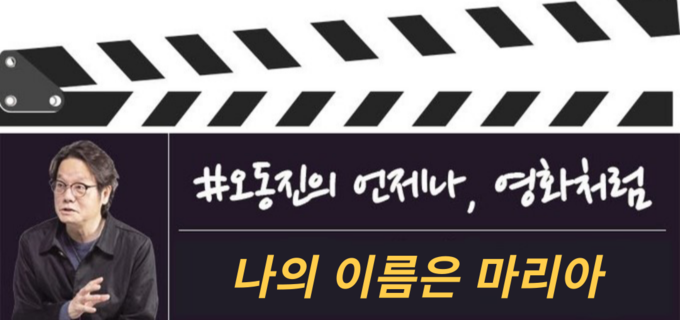
영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다 못해 추악한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당시 주연 여배우였던 마리아 슈나이더의 입장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솔직히, 주요 관계자들이 다 고인이 됐기 때문이다. 감독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는 말년을 휠체어에서 지내다 (마치 이 영화에서 지은 죄과의 대가를 치른다는 듯) 타계했고, 말론 브랜도는 그 훨씬 전에 죽었으며 마리아 슈나이더 역시 비교적 젊은 50대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서 베르톨루치는 강간 신을 찍는 과정에서 대본에도 없었고, 여배우에게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처럼 (실제였을 수도 있는 데다 그것도 항문 섹스 장면이었다) 촬영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화는 미국의 한 좌절한 중년 지식인 남자 폴(말론 브랜도)이 파리에 와서 젊은 여자 잔느(마리아 슈나이더)를 만나고 격렬한 일탈의 정사 신을 이어 나간다는 이야기이다. 1972년 작이다. 이때의 베르톨루치 감독은 '순응자'를 찍은 후였고 '1900년'을 찍기 전이었다. 베르톨루치는 이탈리아를 넘어서서 유럽의 역사, 서구의 역사를 격렬한 서사의 드라마로 만들어 내는데 일가견이 있었으며 당시의 여타 감독들이 그랬듯이(예컨대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처럼) 정치와 섹스를 혼합해 내려 했다. 그 정점에 있는 영화가 바로 그의 프랑스 파리 올 로케 촬영 영화이자 말론 브랜도와 마리아 슈나이더가 나왔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이다.
이 영화 '나의 이름은 마리아'를 보는 데 있어 다음 두 가지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베르톨루치는 왜 이때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찍었으며,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제시카 팔루 감독은 왜, 그것도 지금, 이 영화 얘기를 다룬 '나의 이름은 마리아'를 찍으려 했는가, 이다. 과거와 현재의 두 작품이 갖는 이중의 행동 동기를 생각해 봐야 한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는 68혁명의 소용돌이가 지나가던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을 휩쓸었던 반전 시위들, 좌우의 날카로운 대치와 대척점에서 스스로 이념의 좌표를 한층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서 말론 브랜도가 보인 폭력적 행동은 (그는 여자를 강간하면서 ‘종교는 야만인들을 교육한다’를 중얼거리고 그걸 여자에게 따라 하게 시킨다. 이건 수많은 포르노그래피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성적인 흥분을 강요하기 위해 요구하는 대사를 연상케 한다) 보수와 역사적 반동의 움직임을 혐오하고 경멸하게 하려는 처사처럼 느껴진다. 그런 정치성은 차치하거나 무시되고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당연히 흥행도 뒤따랐다.
'나의 이름은 마리아'의 원제는 ‘마리아 되기(Being Maria)’이다. 원작 소설은 마리아의 사촌 동생 바네사 슈나이더가 쓴 '너의 이름은 마리아(불어판 제목이다. 영어판 제목은 ‘내 사촌 마리아 슈나이더')이다. 제시카 팔루 감독은 영화 속에서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 누르라는 캐릭터(셀레스트 브룬켈)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 바네사는 아마도 마리아 슈나이더(아나마리아 바르톨로메이)의 생전에 그녀를 가장 잘 이해했던 인물일 것이다. 감독 제시카 팔루는 마리아와 누르(바네사 자신일 수 있다)를 동성의 연인 관계로 발전시킨다. 어쨌든 팔루는 마리아 슈나이더의 ‘행복하지 않았던 (‘불행했던’이 아니고) 여배우로서의 생애를 돌아보며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그리고 영화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여자로서의 배우’가 착취되고 소모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마리아 되기, 곧 마리아를 올바로 이해하면 여성의 문제, 여배우로서의 정체성, 너와 나 모두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는 데 있어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영화 속에서 슈나이더는 누르와 인터뷰 도중 이렇게 말한다. “문제의 그 장면을 찍은 후 두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 베르톨루치와 브랜도 둘에게. 촬영이 끝나고 아무도 내게 사과하지 않았어.” 슈나이더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첫 주연작이었으며, 이 영화 이후 영화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작품에 출연하지 못했고, 헤로인 중독에 시달렸으며 사람들이 보내는 따가운 ‘시선 강간’의 피해망상에 시달렸다. 영화 '나의 이름은 마리아'의 전반부는 문제의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 후반부는 마리아가 쇠락하고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영화감독이 여배우를 예술적으로 착취하고 소모한 사례는 많다. 오시마 나기사는 '감각의 제국'에서 마츠다 에이코를 소모했고 배우 김태연은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 이후 출연작을 거의 가지지 못한 채 사라졌다. 탕웨이는 '색, 계' 논란을 딛고 스스로 잘 성장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그러나 결국 예술적 착취 논란 역시 예술이나 영화의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질의 문제이며 따라서 쉽게 정의하거나 일도양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시카 팔루의 영화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뜨거웠던 1970년대 여배우의 일생을 차분하게 톤다운 시키려는 태도가 역력해 보인다. 근데 다소 지나치게 눌렀다. 문제는 베르톨루치니 말론 브랜도니 하는 옛날 감독과 배우를 전혀 모르는 세대의 관객들에게 이 이야기가 갖는 복잡성, 이유, 의미를 전달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보지 않은 세대에겐 다소 지루한,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일생의 드라마일 뿐이다. 게다가 그 파란만장에서 파란의 아우라도 좀 빠져 있다. 아마도 '나의 이름은 마리아'는 70년대와 베르톨루치의 영화와 말론 브랜도를 기억하고 추앙했던 올드 세대‘만’을 위한 영화일 수 있다. 이 영화가 조기에 큰 극장에서 종영된 이유로 보인다.

마리아 슈나이더 역을 맡은 아나마리아 바르톨로메이는 프랑스의 차세대 주자급이다. 할리우드에서 스타가 된 쿠바 출신의 아나 데 아르마스 같은 배우가 프랑스에 있다면 아나마리아 바르톨로메이일 것이다. 바르톨로메이의 전작 '레벤느망'은 그녀의 연기 덕에 만들어진 보기 드문 역작이었다. 말론 브랜도 역에 맷 딜런이 캐스팅됐고 싱크로율 백 퍼센트에 가깝게 캐릭터를 만들어 냈지만 (맷 딜런은 브랜도가 얘기할 때처럼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고 웅얼거리는 걸 그대로 따라 한다) 영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다지 인상적으로 배치되지 못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역의 주세페 마지오는 아무런 효능감을 보이지 못한다. 제시카 팔루의 연출이 지나치게 ‘평평한’ 탓이다. ‘큰 영화 역사’에 짓눌려 있는 듯 보인다. '나의 이름은 마리아'는 보는 영화보다는 ‘읽는 영화’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1970년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논란을 정리하기에는 좀 심심하다. 지난 11월 26일에 개봉했다. 소수의 예술 영화 전용관에서 상영 중이다.






































































































































































































